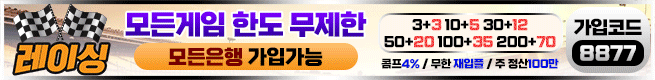소설

파도를 거스르는 아이
그 섬에 가게 된 건, 운명이었을 지도 모른다.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팔찌가 고장이 나자 그 팔찌를 만들었다고 들은 섬으로 떠나게 된 정인. 겸사겸사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추억도 찾아보려고 했으나 그곳은 무인도나 다름없는 곳이었다. “내, 내가 할게. 괜찮아.” “씻을 때도 그 팔찌를 차는가 봐.” 이상하게도 팔찌를 벗기는 것에 집착하는 한 남자. “매일 그리 울면 얼마 안 가 섬이 잠기겠다.” 그리고 그는 수상할 정도로 빠르게 정인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. 이별을 죽음처럼 받아들이는 그녀는 사랑을 멀리하려고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주위에서 맴도는데. “외로웠겠구나.” 우습게도 그녀가 이 섬에 와서 가장 생각이 없고, 가장 들뜨고, 가장 우울하지 않을 때는 오로지 그의 곁에 있을 때밖에 없었다. “그보다 더 단 것을 아는데. 줄까?” 죽음과 닮은 남자와 이별을 보내지 못하는 여자는 그 섬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절을 보내고 있었다. 《파도를 거스르는 아이》
회차
연재목록
별점
날짜
추천